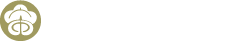인물정보
송응현(宋應賢)
(목)장사랑공파

양오당(養吾堂) 송응현(宋應賢) 묘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내사리 산273 |
양오당(養吾堂) 송응현(宋應賢)은 장사랑공(將仕郞公) 호년(胡年)의 현손이자, 무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인수(仁壽)의 자제로 태어났으니 임진왜란 때 순절한 의수(義壽)는 그의 숙부가 되신다. |
|
일찍이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도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전국시대의 병법가인 손빈(孫殯)·오기(吳起)의 무술을 일찍이 익혔으며 장성하자 붓을 버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部長)에 선발되었다. 그 후 그는 무기의 빈약함을 시정하려다 권세 있고 간사한 무리들의 뜻에 거슬려 결국 벼슬을 버리고 영남으로 내려와 정착하였다. 처음에 부산 동래(東萊)에 일시 거처하다가 밀양(密陽)에 자리를 정하고 서당을 열어 양오당(養吾堂)이라 이름을 붙이고 학문을 강론하던 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왜적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를 마구 침범하니 그는 “내가 비록 일찍이 한 고을도 맡아 다스리지 못했으나, 평생 강론한 바는 충성과 의리일 따름이다. 어찌 가히 군부(君父)의 피난을 앉아서 보고 적병을 물리침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아들 양곡(陽谷) 걸(傑)과 함께 의병(義兵) 수백 명을 모집하여 부자는 눈물을 뿌리며 곽재우(郭再祐) 군사와 합세하려 하였다. |
|

양오당(養吾堂) 송응현(宋應賢) 충적비(忠蹟碑)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계전리 |
곽재우(郭再祐) 군사와 합세하러 가던 도중 적병을 만나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그러나 왜병은 그의 부자가 이끄는 군사보다 숫자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마침내 부자는 장렬히 순절하고 말았다. 양오당은 곽재우의 진지에 다다르기 전에 곽재우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